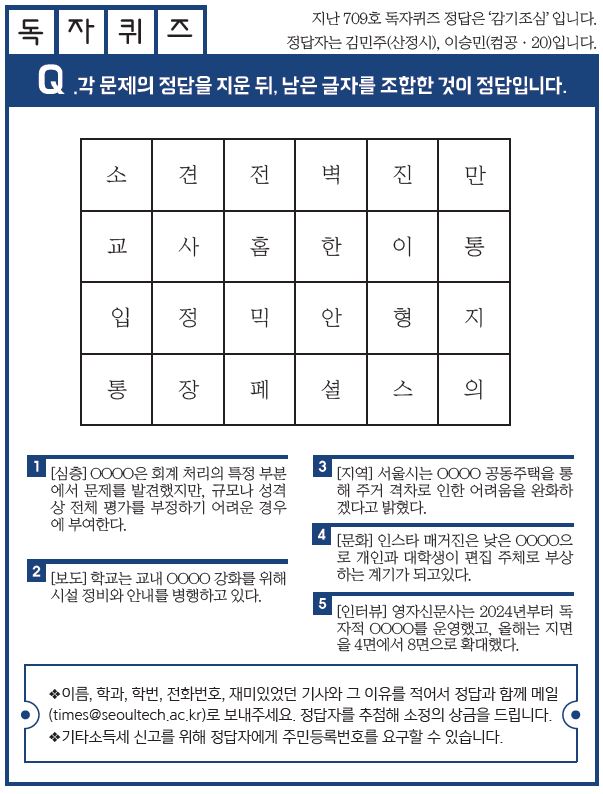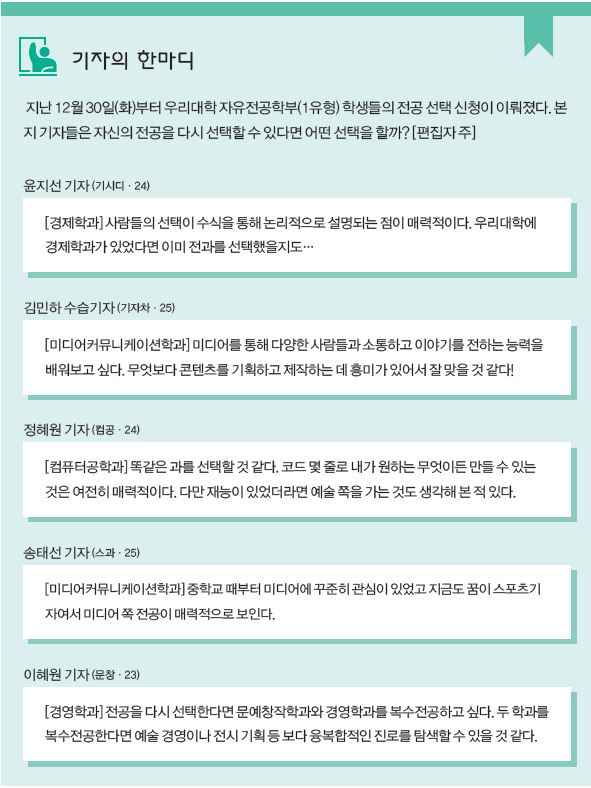빙글빙글 돌아가는 왈츠처럼
[우리도 사랑일까 (원제: Take This Waltz)], 사라폴리

우리는 의심한다. 이게 사랑일까? 사랑이란 뭘까?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 그저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반응할 뿐이다.
5년 차 부부인 마고(미셀 윌리엄스)와 루(세스 로건). 겉보기엔 행복한 둘이지만, 마고는 편하고 익숙한 관계에 권태를 느끼고 있었다. 매일같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롭고 독특한 표현방식으로 현재의 사랑에 관해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공허하기만 하다.
그런 그녀에게 대니엘(루크 커비)은 커다란 감정적 동요를 가져다준다. 강렬한 끌림과 설렘. 머리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떨쳐내기 쉽지 않다. 루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일까, 정일까. 대니엘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일까, 새로움일까. 사랑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닌 척 루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옳은 선택일까?
우리의 인생에도 마고와 같은 선택의 순간들이 몇 번 있을 것이다. 마음과 이치 중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후회되지 않을지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우리 또한 마고와 비슷한 순간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나 또한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영화를 본 후 그녀를 선뜻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새 것도 언젠간 헌 것이 된다는 것, 헌 것은 한때 새 것이었다는 것을. 놀이 기구를 타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마고와 대니엘의 뒤로 ‘Video killed the Radio Star’라는 노래 가사가 흘러나온다.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던 것처럼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이전의 것은 쉽게 잊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또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인생에서 반복될 뿐이다.
사람의 감정엔 영원한 것도, 견고한 것도 없다. 그저 각자 불안정한 채로 위태롭게 견디고 있는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은 마고 혼자서 놀이 기구를 타는 모습으로 끝이 난다. 결국 우리 삶의 빈틈은 다른 누군가로 채워질 수 없다. 영화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인생엔 당연히 빈틈이 있기 마련이야. 그걸 미친놈처럼 일일이 다 메울 순 없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충족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비어있는 채로 남겨 두는 것도 그 또한 인생이기에,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앞으로도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각자의 빈틈을 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추천한다.
장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