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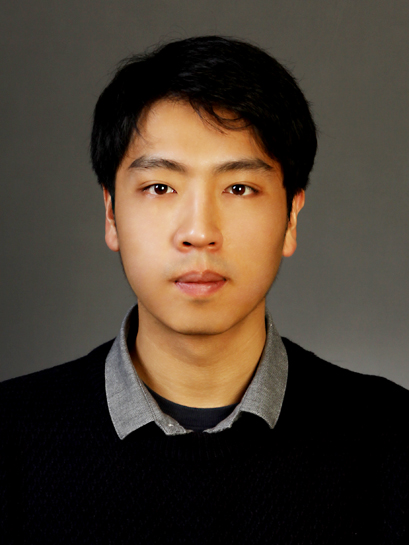
김영서
(행정ㆍ19)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저서를 내면서 종종 언론을 통해 용어가 소개되곤 했다. 갤브레이스는 현대 사회를 주도하는 원리인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등 확신을 줄 수 있는 철학이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불확실성을 넘어서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주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과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은 2017년 경제학 교수인 배리 아이켄그린이 처음 사용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기행, 영국의 브렉시트, 신흥시장이나 약진 등 훨씬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종류의 어떤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
이렇게 상황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초조하며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러 언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융합이나 창의적 인재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인터넷상에는 몇 년 후에는 사라질 직업 순위가 매겨져 떠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더욱더 와 닿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무엇이 뜨고 무엇이 질지, 그들이 어떻게 안 다는 것인가? 추상적인 창의적, 융합 인재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다.
기자는 군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불안함을 잊기 위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다가 고민을 해결해줄 것 같았던 책이 있었다. 그 책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었다. 저자는 현대인의 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을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이라는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저자가 말하는 불안의 원인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중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인 것이다. 성취에 관한 기준은 언제부턴가 ‘내가 보는 나’가 아닌 ‘세상이 보는 나’가 기준이 됐다. 작가는 성취에 대한 나의 기대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수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성취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를 낮추는 것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작가는 “정상에 오르면 곧 불안과 욕망이 뒤엉키는 새로운 저지대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 하는 지점의 욕망은 우리 자신의 온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올라가더라도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기자는 당시 이 책을 읽고 난 후 사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 덜어냈다. 또 미래에 관해 고민하는 것도 멈췄다. 지금 바꿀 수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오늘밖에 없다. 그 오늘은 매일 쌓여 내 미래를 바꾸므로 현재에 충실하며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자신의 직업이 사라진 과거의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었을까? 분명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며 먹고 살길을 다시 찾아 나갔을 것이다. 기자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은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의연하고 초연한 마음가짐과 자신만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앞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바라건대 여러분의 영혼을 불안에 맡기지 않기를 바란다.
 기사 댓글 0개
기사 댓글 0개 욕설,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욕설,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