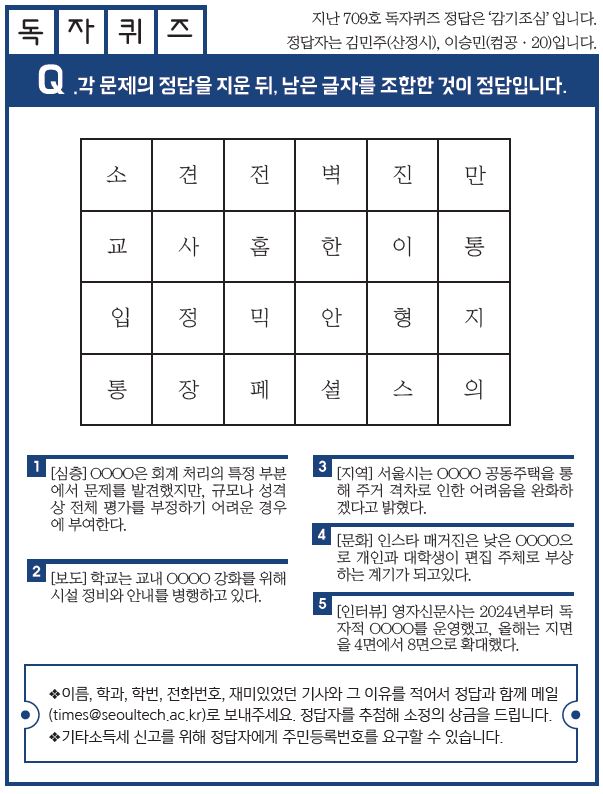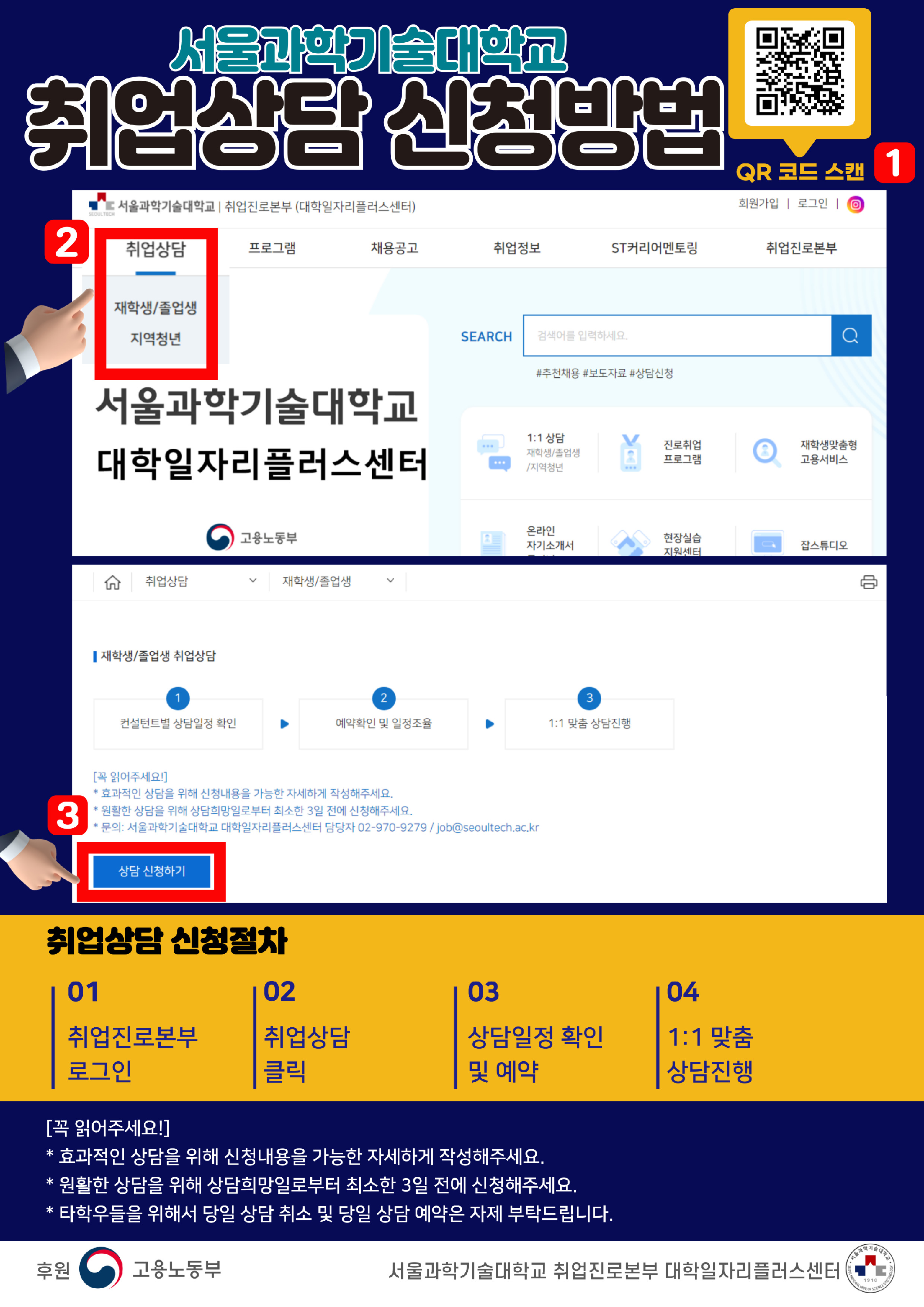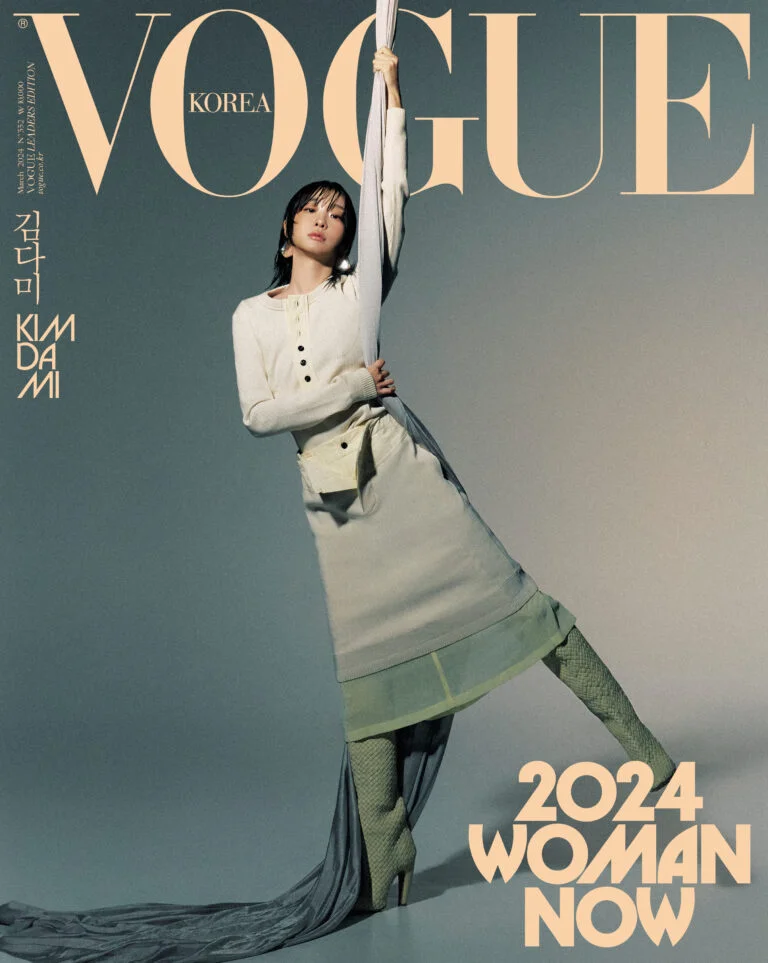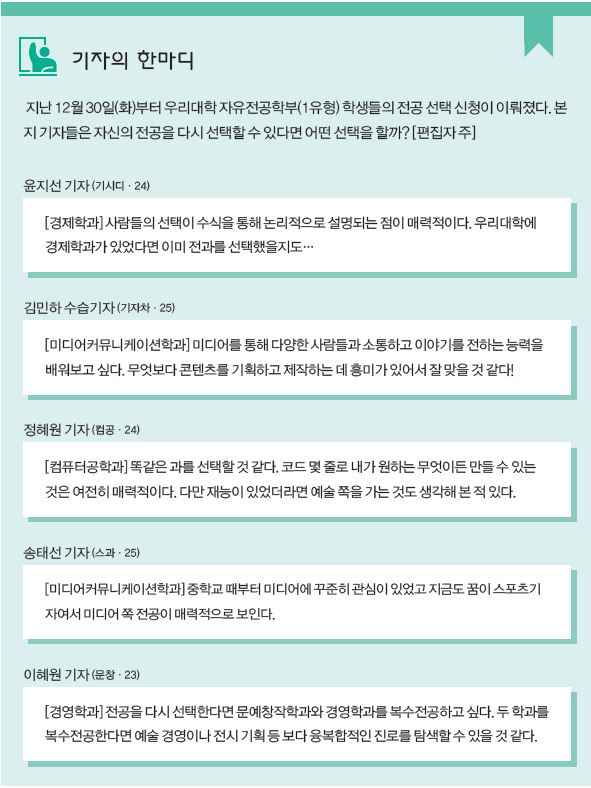나는 왜 알려고 하는가
 조유빈(기자차·20)
조유빈(기자차·20)
기자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아주 많았다. 유치원생 시절엔 불이 나오지 않는데도 가열이 가능한 하이라이트가 신기해 만지다가 화상을 입었다. 중학생 때는 학원을 마치고 오는 길에 밤하늘을 관찰하며 궁금증을 정리하느라 길에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심지어 콘센트에서 제거한 드라이기의 플러그를 만졌다가 잠깐 감전을 당하자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하며 몇 번이고 더 시도한 적이 있다. 참 이상하고도 위험한 본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호기심이 본인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줬고, 기자는 스스로 더 알아내고 싶은 길을 찾아다녔다.
지금 이 글의 주제를 떠올리게 된 것도 결국 기자의 호기심에 의한 것이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그 날 하늘은 군데군데 새하얀 구름들이 자리 잡은 푸른 모습이었다. 감상도 잠시, 높고 낮은 구름을 보며 고등학교 때 배운 적운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의 개념을 상기했다. 그리고 넓은 시야로 하늘을 보며 여러 요소를 분석하고, 궁금증을 정리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새로운 걸 알게 될 것에 설렜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다. ‘왜 나는 이토록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할까?’
사실 살아가는 자체가 앎의 연속이다. 호기심은 인간의 본능이며 인류의 사회·과학적 진화는 새로운 걸 알아내는 단계들과 함께했다. 모든 성장은 앎을 토대로 나타난다. 이에 기자는 본인이 앎에 의한 성장을 추구한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걸 알아내고 또 알아내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길을 열어준다. 음악을 그냥 듣는 것과 뒤에 들리는 악기가 무엇인지 알고 듣는 것은 다르다. 그림을 그냥 보는 것과 당시 화가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보는 것은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파란 하늘을 그냥 바라보는 것과 그 속의 달을 찾아내 천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다르다. 몰랐을 땐 보지 못했던 것들, 듣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이미 내가 다른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모든 세상의 길이 앎을 통해서만 열리는 건 아니다. 본인이 가진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과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도 어릴 적 수많은 세상을 만들어 봤을 거라 기자는 확신한다.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엔 한계가 존재한다. 창의성이 아닌 논리적인 사고에 있어 애초에 새로 주어지는 게 없다면, 길을 만들 공간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앎은 끝없이 계속돼야 한다. 논리적 사고의 공간을 넓혀 수많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알고 또 알아내야 한다.
정신적인 부분 외에도 앎은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다. 평등에 가까운 사회를 위해선 예리한 비판이 필요하다. 상황에 관한 올바른 비판이 이뤄지려면 그 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결국 앎이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만들고, 예리한 시각은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든다. 만약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이의 비판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섣부른 비판과 그에 의한 사회적 결정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또 다른 불상사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겪은 세상의 범위가 적다면 나는 그 틀 안의 사회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더 넓은 사회에 본인의 소리를 내고 싶다면 더 많은 경험과 앎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시간을 살아간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그 시간이 연장되곤 있지만, 신체적인 영원함은 없을 것이다. 한정된 시간 속에 갇혀 좁은 세상만을 돌아다니고 싶은가? 기자는 끝없는 세상을 누리고 무한한 생각을 하고자 한다. 호기심의 본능과 고찰을 통해서라면 무한한 세계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기자가 생각하는 앎의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