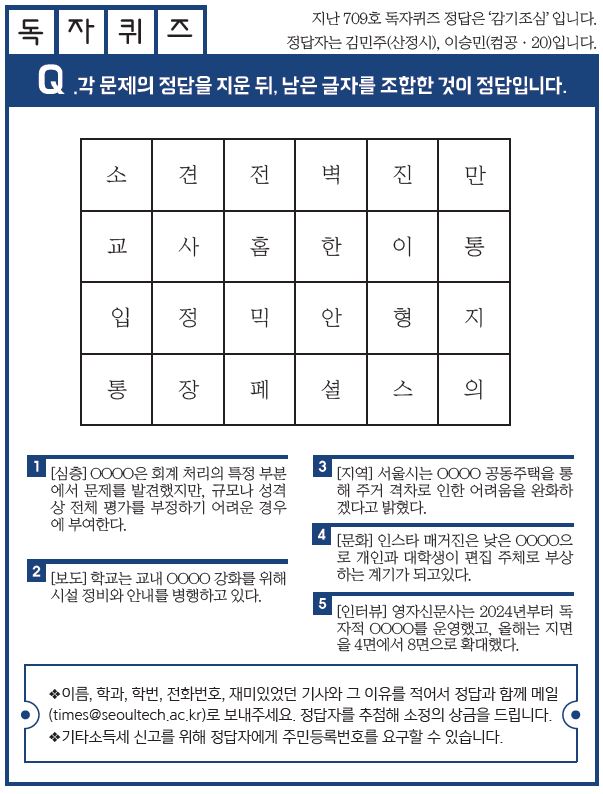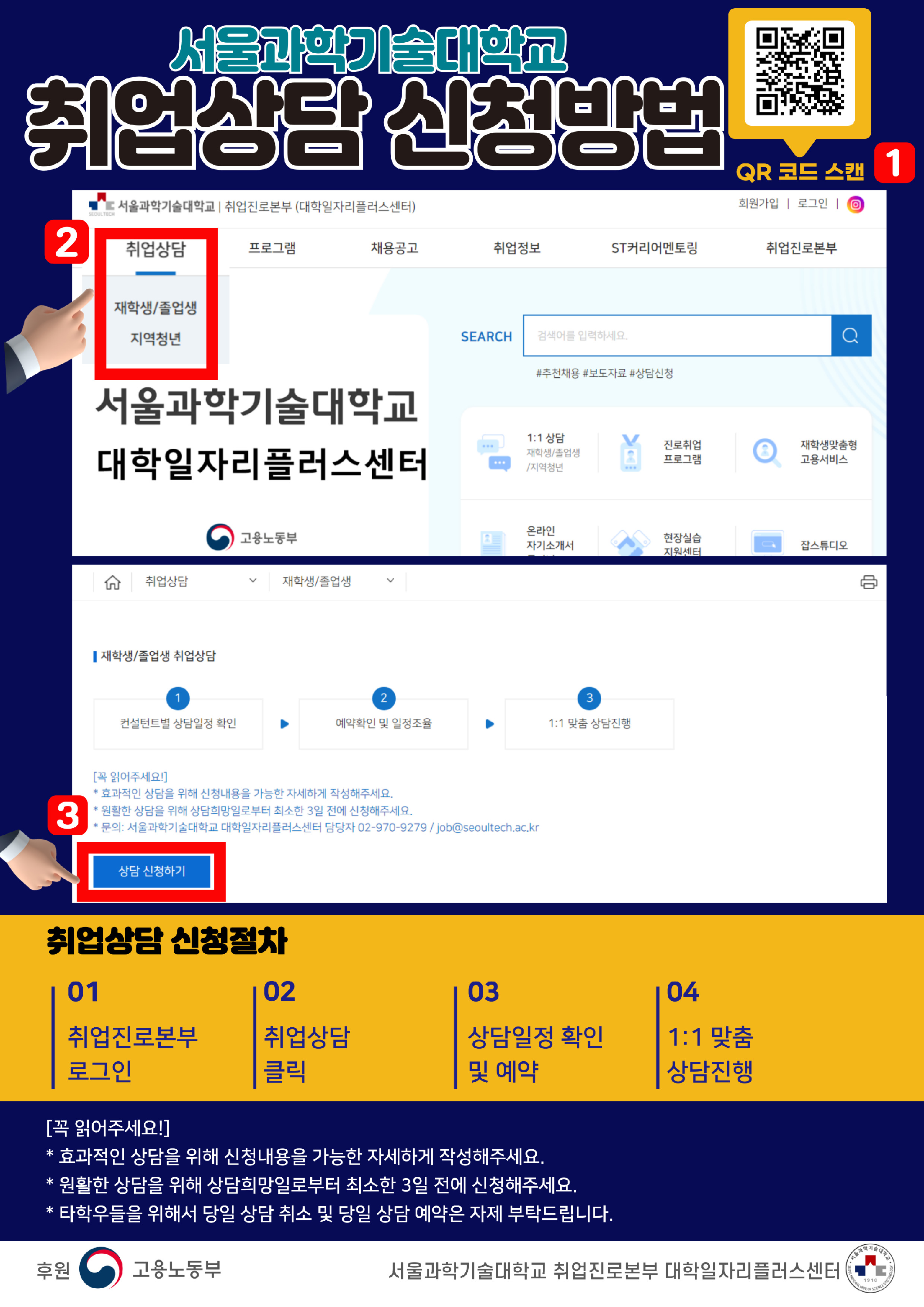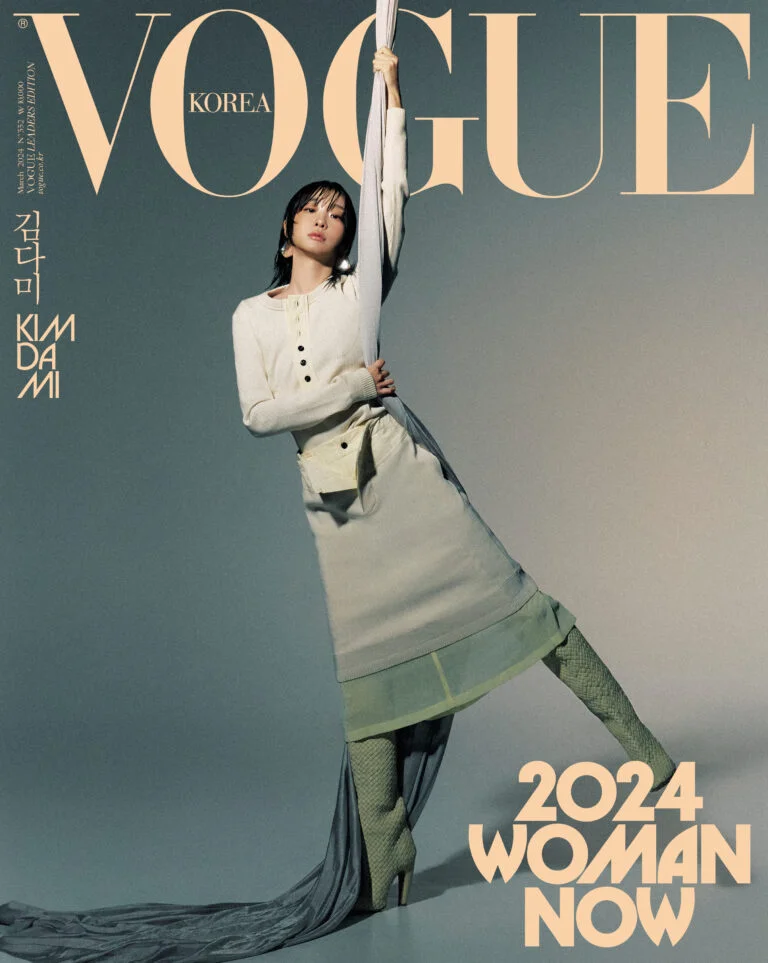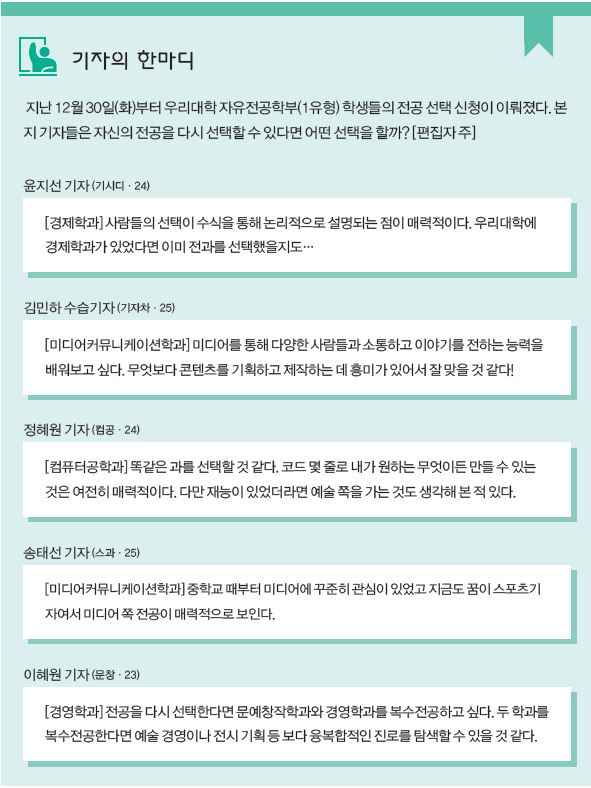장수연(산공·19)
장수연(산공·19)
차일드와 어른 사이,
그 중간 지점에서
22살, 이제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그래도 아직은 인생에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이 차지하기 때문일까. 기자는 스스로를 떳떳하게 어른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곧 휴학을 앞두며 그간의 대학 생활, 그리고 스무 살 이후의 나를 자꾸 되돌아보게 된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기자의 대학 생활은 자신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조차 차마 보여주기 부끄러운 나날들로 기억된다. 학업이나 대외활동, 대인관계 등 어느 곳에조차 노력하지 못했고, 하루의 끝을 성취보다는 실망과 자책으로 끝냈던 날이 더 많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19살에서 20살이 된다고 스스로가 변한 것은 전혀 없었다. 단지 나를 둘러싼 환경만이 변화했을 뿐이었다. 성인이 되면서 변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기자는 무모한 도전이나 선택을 한 적이 많았다. 거기서 겪었던 실패와 좌절감은 여전히 후회로 남아 오랜시간 자신을 괴롭히기도 했다. 20살의 기자는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억지로라도 붙잡고싶어 했다.
기자가 좋아하는 영화 중 <더 차일드>라는 영화가 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 기자에게 위로가 됐던 영화이다. 더 차일드는 20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아이를 가지게 된 브뤼노에 관한 이야기이다. 무책임하고 철없던 브뤼노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팔아치운다. 이내 그는 아이를 되찾아오지만,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갈취도 서슴치 않는다. 영화에서 브뤼노는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그에 따른 죗값을 치른다. 도무지 용서하기 힘든 윤리적 중죄를 저지른 소년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
<더 차일드> 속 차일드는 바로 브뤼노다. 몸만 큰 아이였던 브뤼노가 성장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하다. 사는 게 그렇다. 결국에는 직접 후회하고 그만큼 아파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이 영화가 기자에게 그토록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마지막 장면 때문이었다. 감옥에서 여자친구 소냐와 함께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브뤼노의 모습은 그의 변화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자에게 그 장면은 모든 후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떻게든 살아가라는 메시지로 느껴졌다.
나이를 먹었다고 모두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어른이 되고 가장 버겁게 느껴졌던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의 모든 선택과 그에 따른 후회와 고통도 오로지 혼자만의 몫이 된다. 모두가 그럴 것이다. 아직 제대로 된 어른이 되기도 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던 브뤼노처럼, 우리는 어떠한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어른이 되라고 내던져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누군가는 이 말이 20대가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기자는 이 말에 대해 누구보다 동의하는 바이다. 아파하면서 어른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변했기 때문이다.
기자는 20대가 아이와 어른의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은 나이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픈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는 어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기자는 모든 20대에게 결국 견뎌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을지라도, 또 너무 힘들지라도 우리는 견뎌내며 어른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