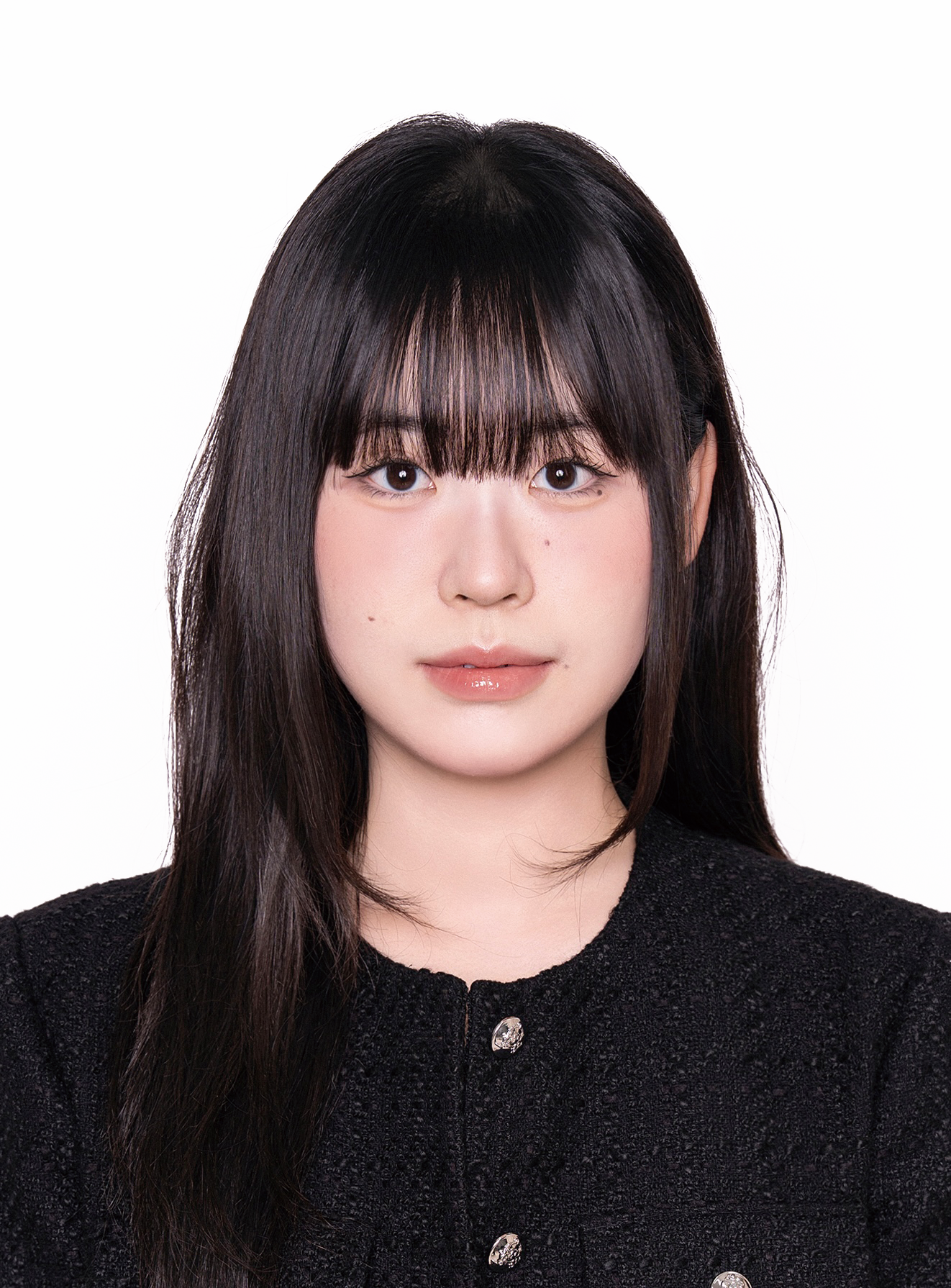
▲ 이혜원 기자(문창·23)
이 세계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에 필연적으로 유해하다. 누군가는 흉기를 든 채 길거리를 누비고, 또 누군가는 기계에 끼여 사망한다. 어떤 이는 키우던 반려견을 폭설 속에 버리고, 또 다른 이는 자식이나 부모에 의해 생을 빼앗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아포칼립스다. 이런 비극 속에서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세계의 비정함은 시간의 연속성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자식은 유년시절의 상처로 인해 무정한 인간이 되고, 어떤 유족은 피해자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건 전화를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 못했다며 후회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한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 그때 그곳으로 돌아가 진심을 고백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모님이 정정하셨을 때로 하루만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변혜지 시인은 자신의 시집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에서 선형적인 시간을 뒤틀고 가상의 공간을 도입해 세계의 멸망을 지연시킨다. 시인의 “멸망한 세계”는 외계 생명체가 들끓고 인류가 멸종한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두 발 붙이고 선 바로 이 세계이다. 비정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계. 그럼에도 결코 도피할 수 없는 세계. 시에서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세계와 대비되는 가상적 공간의 개념이 바로 만화나 꿈속 세계인 이세계다. 이세계는 일본 서브컬처 문화에서 현실 세계의 욕망이나 충동을 충족시켜 주는 판타지적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집의 시 「세카이계 만화」에서는 만화 속 히어로로 보이는 ‘여자애’가 온몸이 박살 난 채 무자비한 악인에게 맞서 싸우고 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악인을 붙잡았으나 이미 여자애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희생된 후였다. 울부짖는 음성과 붙잡힌 한 사람. 이 시는 단순히 히어로 만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연쇄적으로 발생해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을 은유하고 있다.
세카이계 만화」에서 인간성을 잃은 인간과 그로 인해 멸망하는 세계를 포착한 시인은 또 다른 시 「내가 태어나는 꿈」에서는 회복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이 태어나던 날의 꿈을 꾼다. 꿈에서 화자는 자신을 낳고 잠든 젊은 부모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축복을 빌어준다. 이윽고 꿈에서 깨어난 화자는 늙어버린 부모를 바라보며 그들을 다시 열심히 사랑할 것을 다짐한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일이 빈번한 우리의 세계에서 「내가 태어나는 꿈」은 가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세계는 여전히 비정하게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곳은 동화 속의 환상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대체할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했다.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허망하게 떠나보내야만 했던 곳일지라도 이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시인은 지금의 세상을 멸망한 세계라고 표현했다. 좀비도 운석 충돌도 없지만 소중한 사람을 언제 어떤 이유로 잃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를만하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후회의 대부분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한한 시간의 흐름에서 비롯된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는 현재의 내가 해소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때 시의 ‘꿈’이나 ‘만화책’ 같은 비일상적 장치를 통한 환상적 시공간과의 접촉은 현실적 시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당연시했던 삶의 가치와 생명의 무게를 실감하게 만든다.
문학은 현실을 반영해 성찰을 유도한다. 죽음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는 현실에 우리는 조금 둔감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둔감함은 사회에 속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감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타인의 부재와 방황에 무감각해지지 않아야 한다. 타인을 조금 더 많이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들어주는 것. 어쩌면 변혜지 시인은 그 사소함이 세계를 유지하는 전부라고 여기는지도 모른다.















